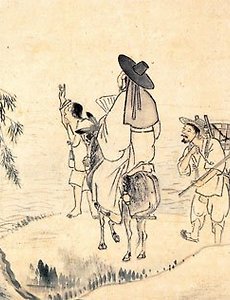 남인백수 1세대, 성호 이익이 사는 법 ①
남인백수 1세대!성호 이익, '절용'과 '실용'을 사유하는 산림학자! 남인 백수, ‘성호’ 선비가 사는 법 ① 자! 이제 남인계의 백수 선비, 성호 이익(李瀷, 1681~1763)을 만날 차례다. 성호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자, 중농학파(重農學派)라는 분류 아래, 현실 개혁에 힘쓴 학자로 유명하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조선의 학자들 중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2)만큼 각광받은 인물은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세 학자는 봉건적인, 철저히 반근대적인, 실질은 없고 공리공론의 형이상학만 난무하는 조선에 실학이라는 하나의 광명을 비춘 존재들로 근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선에 내재한, 근대로의 행로[발전]는 바로 이 세 학자들 때문..
2014. 5. 27.
남인백수 1세대, 성호 이익이 사는 법 ①
남인백수 1세대!성호 이익, '절용'과 '실용'을 사유하는 산림학자! 남인 백수, ‘성호’ 선비가 사는 법 ① 자! 이제 남인계의 백수 선비, 성호 이익(李瀷, 1681~1763)을 만날 차례다. 성호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자, 중농학파(重農學派)라는 분류 아래, 현실 개혁에 힘쓴 학자로 유명하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조선의 학자들 중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2)만큼 각광받은 인물은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세 학자는 봉건적인, 철저히 반근대적인, 실질은 없고 공리공론의 형이상학만 난무하는 조선에 실학이라는 하나의 광명을 비춘 존재들로 근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선에 내재한, 근대로의 행로[발전]는 바로 이 세 학자들 때문..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