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선생님의 신간 『칸트 예지계 강의』가 출간되었습니다.
북드라망 & 북튜브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북튜브 출판사 신간 『칸트 예지계 강의』가 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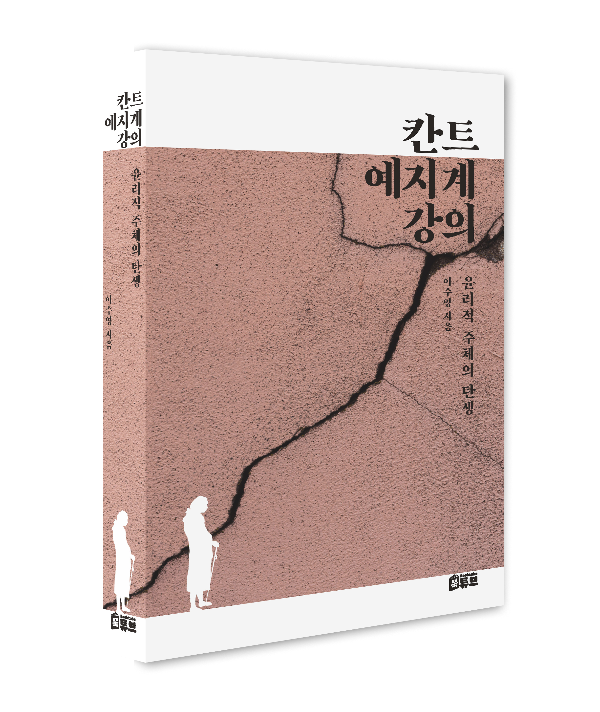
『순수이성비판 강의』와 『실천이성비판 강의』로 우리에게 칸트의 원전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축복(!)을 선사해 주었던 이수영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칸트의 윤리’라는 묵직한 주제를 담은 신간 『칸트 예지계 강의』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이 책은 <글공방 나루>에서 기획한 강좌 시리즈 ‘월간 이수영’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총 11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 강좌에서 이수영 선생님은 ‘물자체’부터 ‘보편성’까지 칸트 철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념과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 ‘교육’, ‘폭력’, ‘운명’, ‘환상’, ‘자유’ 같은 여러 개념들이 칸트 철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졌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책에 담겼는데요. 무엇보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예지계’라는 개념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계가 있고 물자체가 그 외부에 있다? 이런 이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계와, 그 바깥에 신의 나라를 구성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칸트의 물자체(예지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계입니다. 우리는 현상계만을 종합하고 현상계만을 개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현상계와 예지계라는 두 영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물자체는 어떤 사물이나 세계처럼 자신의 영토를 갖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현상계 자체의 내재적 한계 혹은 균열, 그것이 바로 물자체입니다. 물자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계의 한계의 형태로만 표현될 뿐입니다.(35쪽)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인간의 경험과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경험의 너머에 있는 ‘물자체’라는 개념을 도출해 내죠. 이 개념을 통해 칸트는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인간이 시공간이라는 형식 속에서 경험하는 세계를 ‘현상계’라고 하고, 물자체의 세계, 다시 말해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예지계’라고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칸트의 ‘예지계’ 개념은 흔히 이 세상 외부에 있는, 초월적이고 가상적인 자리를 갖는 어떤 것이라고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이수영 선생님은 예지계가 현상계와 맞닿아 있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상계의 내재적 한계나 균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균열로서의 ‘예지계’가 칸트의 윤리가 구성되는 지점이라는 것이 이 책 『칸트 예지계 강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형식적’ 명령이야말로 가장 생생하게 주체의 자유를 살아 있도록 합니다. ‘원리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누가 판단해야 할까요? 판단을 타인이 해준다면 이는 자유에 위배됩니다. 해야 할 행위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주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명령이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 이때 주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지만 그 형식적 특성 때문에 결코 기계적으로 추종할 그런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예지계적 주체로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해 칸트적 주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십계명에서 하라고 하잖아요”)도 핑계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고, 철저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인과적으로 나를 압박하더라도 거기서 주체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칸트의 물자체의 세계, 즉 예지계는 이 세계 저편에 있는 그런 초월적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계적 습속의 세계에도 주체가 자유를 행사하는 정언명령의 순간, 예지계는 그 균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42~43쪽)
칸트의 정언명령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명령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이지만, 동시에 주체가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항해서 오빠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고집한 안티고네처럼 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사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행하기, 이것이 바로 칸트의 철학이 품고 있는 ‘윤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은 이렇게 도출한 칸트의 ‘윤리’를,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문제들에 접목시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를 둘러싼 비난, 한국의 교육, 물신주의적 환상의 만연, 진영 대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고려’들이 무조건적인 명령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칸트의 무조건적인 윤리가 오늘날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칸트 예지계 강의』는 서점에 있습니다~
'북드라망 이야기 ▽ > 북드라망의 책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프터 해러웨이』 표지의 특별한 뒷날개 글을 꼭 읽어 주세요! (3) | 2025.07.22 |
|---|---|
| 『애프터 해러웨이』 지은이 김애령 선생님 인터뷰 (2) | 2025.07.18 |
|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이야기가 필요하다”―해러웨이 이후, 해러웨이를 따라 읽고 쓰고 엮은 김애령 샘의 책 『애프터 해러웨이』가 출간되었습니다! (0) | 2025.07.17 |
| 『동네 병원 인문학』 지은이 내과 전문의 이여민 선생님 인터뷰 (0) | 2025.03.04 |
| 망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구에서 함께 살기 - 신간 『자본주의와 생태주의 강의』가 출간되었습니다. (0) | 2025.01.31 |
| 성태용 선생님의 신간 『지혜로운 삶을 위한 동양사상 강의』가 출간되었습니다. (0) | 2025.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