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
고전을 읽기 전에 『고전 톡톡』부터!? 18세기 문인 중에 이옥(李鈺, 1760~1815)이라는 자가 있다. 그가 「독주자」(讀朱子)라는 글에서 주자의 문장을 힘센 계집종, 늙은 암소, 쌀, 소금, 돼지 등에 비유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하는 말인즉, “주자의 글을 서리가 읽으면 장부 정리에 익숙할 수 있다”는 거였다. 처음 이글을 읽었을 땐,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호된 인생경험을 한 이옥이 주자의 문장을 조롱하는 것이려니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어쩌면 그 말이 진심이었을 거라는 데 생각이 이르렀다. 그렇다. 좋은 책을 읽으면, 이해 여부나 취향하고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는 남는다. ― 채운+수경 기획·엮음, 『고전 톡톡』, 머리말 좋은 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
2015. 3. 9.
좋은 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
고전을 읽기 전에 『고전 톡톡』부터!? 18세기 문인 중에 이옥(李鈺, 1760~1815)이라는 자가 있다. 그가 「독주자」(讀朱子)라는 글에서 주자의 문장을 힘센 계집종, 늙은 암소, 쌀, 소금, 돼지 등에 비유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하는 말인즉, “주자의 글을 서리가 읽으면 장부 정리에 익숙할 수 있다”는 거였다. 처음 이글을 읽었을 땐,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호된 인생경험을 한 이옥이 주자의 문장을 조롱하는 것이려니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어쩌면 그 말이 진심이었을 거라는 데 생각이 이르렀다. 그렇다. 좋은 책을 읽으면, 이해 여부나 취향하고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는 남는다. ― 채운+수경 기획·엮음, 『고전 톡톡』, 머리말 좋은 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
2015.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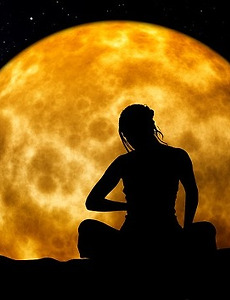 [임신톡톡] 임신 9~10개월, 형체와 기운의 균형
형체를 단단하게, 기(氣)를 충분하게 아홉째 달, 석의 정기를 받아 뼈마디가 완전해진다 그 산꼭대기에는 신령한 돌이 하나 있었는데, (중략) 이 바위는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로 항상 하늘의 참된 기운과 땅의 빼어난 기운, 그리고 해와 달의 정화를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감응하다 보니 마침내 신령하게 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안으로 신선의 태(胎)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이 쪼개지면서 돌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둥근 공만 했어요. 그 돌 알은 바람에 노출되어 깎이다가 모양이 돌 원숭이처럼 변했지요. ─오승은, 『서유기』 1권, 서울대학교 서유기 번역연구회 옮김, 솔 출판사, 34-36쪽 『서유기』에 서술된 손오공의 탄생 과정이다. 저팔계‧사오정과 함께, 삼장법사를 모..
2015. 3. 5.
[임신톡톡] 임신 9~10개월, 형체와 기운의 균형
형체를 단단하게, 기(氣)를 충분하게 아홉째 달, 석의 정기를 받아 뼈마디가 완전해진다 그 산꼭대기에는 신령한 돌이 하나 있었는데, (중략) 이 바위는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로 항상 하늘의 참된 기운과 땅의 빼어난 기운, 그리고 해와 달의 정화를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감응하다 보니 마침내 신령하게 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안으로 신선의 태(胎)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이 쪼개지면서 돌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둥근 공만 했어요. 그 돌 알은 바람에 노출되어 깎이다가 모양이 돌 원숭이처럼 변했지요. ─오승은, 『서유기』 1권, 서울대학교 서유기 번역연구회 옮김, 솔 출판사, 34-36쪽 『서유기』에 서술된 손오공의 탄생 과정이다. 저팔계‧사오정과 함께, 삼장법사를 모..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