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고 못 뛰는 몸으로도 당당하게
곽승희(감이당 대중지성)
몇 년 전 ‘이런 게 노쇠해진다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에 당황스러운 적 있었다. 마을버스 안에서 균형을 잡은 채 서 있는 일이 힘들었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하차 문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하차문 계단에서 인도에 폴짝 뛰어내리는 것도 역시였다. 달리는 차 안에서 균형을 잡고, 평소보다 조금 빨리 걷고, 살짝 뜀박질을 하는 그 모든 행동에 어깨와 척추와 무릎과 발목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자 우울해졌다. 앞으로도 ‘이런 몸’에서 살면 어쩌지 걱정스러웠다. 억울함도 생겼다. 난 아직 이럴 나이가 아닌데! 만약 몸이 회복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노화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됐지만 답은 찾지 못했고 그저 긍정의 힘에 기댈 뿐이었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나와 다르게 이 고민을 화두 삼아 ‘다른 노년의 삶을 질문하는 삶‘의 기록 『한뼘 양생』을 만났다.

‘늙어가는 몸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와 달리 저자는 이 질문을 전방위적으로 던진다.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 속에서, 인간 외 생명체와 교감 속에서, 젊은 시절 소원하던 인연이나 새롭게 만난 인연 속에서, 공동체 연대 활동 속에서, 그리고 저자의 일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던 80대 노모의 돌봄 노동 속에서. 저자는 무차별적으로 질문의 그물을 펼친다. 그리고 동양 고전과 현대 사회과학 서적 등에서 여러 가지 참고 사례를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고 개념화시키려 노력한다. 저자가 이렇게 ‘곡진’하게 “우왕좌왕 뻘짓”(152)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아마 저자가 나이 드는 몸의 당사자이자 노모의 나이듦을 옆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그 돌봄 노동의 당사자였기 때문이리라. 어떨 때는 연구자로서, 어떨 때는 노동자로서, 어떨 때는 활동가로서, 어떨 때는 나이 든 몸의 서글퍼진 당사자로서, 다면적으로 나이듦을 사유했기 때문 아닐까. 저자에게 ‘나이듦’은 자신의 몸에서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자, 가족과 친구들과 타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일상이다. 이 지점에서 몇 년 전 나의 고민이 내 삶을 바꾸는 질문이 되지 못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고민의 방향성을 나 스스로에게 한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 주변의 나이 든 일상까지 둘러볼 때가 아니라 생각했고, 항암 치료 이전처럼 잘 걷는 것이 나의 회복이라 생각했다. 왜 내 몸의 특정 행동에 노화를 연결했는지, 그 연결에 잇따르는 감정이 왜 우울하고 억울했는지 파고들지 않았다. 그래서 저자의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나이듦 말하기에,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시원하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게다가 그 말의 대부분은 노인이 아니라도 ‘건강하지 않은 몸 때문에 번뇌를 일으켰던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정상성을 삶의 목표로 제시하는 생명권력의 시대에 건강하지 않은 ❏❏이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가 된다.”(10),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도 아니고 자본의 먹잇감으로서의 ❏❏도 아닌 ❏❏의 실존 양식에 대해 고민한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이 되어 갈 수 있을까?(151)”, “모든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인데 ❏❏만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202)” 박스 안에 들어갈 말은 ‘노인’, ‘다른 노인’이지만, 거기에 ‘청년’이나 ‘여성’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넣어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고통의 그물에 함께 들어오게 된 걸까. “나이듦은 몸이 손상된다는 것이고 그 몸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 – 주로 배제와 혐오로 작동하는 –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다...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모두 취약한/위태로운 존재(171)”이다.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마 취약하지도 위태롭지도 않은 자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리라. 나의 경우 20대 때 ‘유능한 커리어 우먼’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상을 사는지는 잘 모른 채 몇 가지 단편적인 이미지를 따라 하려고 했다.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월급으로 무언가를 소비하고 등등. 그것이 내가 당연히 지향해야 하는 삶인 줄 알았다. 하지만 40대가 가까워지는 지금은 ‘결과가 늘 의도를 배반’함을 경험했으며 그런 어긋남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게 삶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자가 『장자』에서 찾은 “상실과 절망감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또 그것에 압도되지도 않은 채 살아(223)”가기가 아주 유용해 보인다.
얼마 후 자여가 병에 걸렸습니다...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았으며, 상투만 달랑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자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모습이 싫은가?” 자여가 말했습니다. “아니네, 그럴 리가 있는가? 내 왼팔이 점점 변해 닭이 된다면 나는 새벽을 알리겠네...삶을 얻는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것을 잃는 것도 때를 따르는 것일 뿐일세.”「대종사」, 『장자』 (재인용 220쪽)
자여의 대답은 “그 어떤 것도 본질과 규범에 기초한 유용성이란 없다는 것을 환기(223)”한다. 내가 커리어 우먼으로서 일할 수 있는 때라면 그 노동에서, 그렇게 일할 수 없는 때라면 지금의 일상이나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주변과 관계 맺는 과정 속에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자여처럼 팔이 닭처럼 꼬부라 올라가도 그 팔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기에 “취약한 몸, 의존적인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몸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 몸으로 세계를 새롭게 경험해 가는 다른 쾌락을 발명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224)”
공교롭게도 이 책을 만나 빠져들며 읽는 시기, 다시 빠르게 걸을 수 있는 몸이 됐으나 과거의 느린 몸을 다시 생각해 보던 때, 70대 어머니가 무릎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하셨다. 하루에 1만 보 이상을 걸으며 구청의 길냥이 공공급식소를 관리하고, 보건소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일환인 동네 독거 어르신 방문 활동을 지원해왔던 어머니였다. 다시 이전처럼 걷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답답함과 걱정으로 연결되는 그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못 걷고, 못 뛰고, 균형잡기 어려운 ‘그런 몸’의 쾌락과 유용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 함께 ‘한뼘’씩이라도 그 길을 찾아보자고. 그게 곧 ‘삶을 가꾸는 기예(양생)’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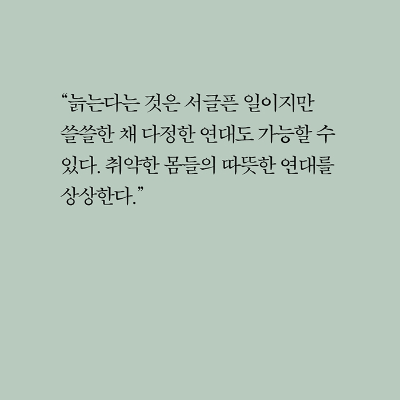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