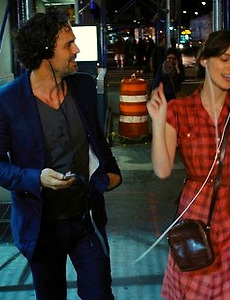 뉴욕과 올리버 색스 ② : 나는 감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웃픈' 이야기로 세상의 구멍을 메워라 (2) - 뉴욕과 올리버 색스 - ❙ 무(無), 기력 올해 초, 내 몸이 파국을 맞았다. 수면 부족, 열꽃, 생리 불순, 무엇보다 온 몸에 기력이 없었다. 지하철에 몸을 던져놓고 무기력하게 되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질문을 더 밀고 나가지는 않았다. ‘바빠서 힘들다’는 말은 뉴욕에서 금기어다. 이 도시에는 파트타임 직업 세 개, 학교, 육아까지 동시에 해내는 ‘슈퍼휴먼’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고작 한 개 하는 학생 주제에, 피곤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저질 체력과 의지박약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다. 그래서 질문은 맥없는 넋두리로 변질된다. 아, 내 몸이 스마트폰이라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간단히 기력을 얻을 텐데……. 왜 ..
2016. 9. 30.
뉴욕과 올리버 색스 ② : 나는 감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웃픈' 이야기로 세상의 구멍을 메워라 (2) - 뉴욕과 올리버 색스 - ❙ 무(無), 기력 올해 초, 내 몸이 파국을 맞았다. 수면 부족, 열꽃, 생리 불순, 무엇보다 온 몸에 기력이 없었다. 지하철에 몸을 던져놓고 무기력하게 되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질문을 더 밀고 나가지는 않았다. ‘바빠서 힘들다’는 말은 뉴욕에서 금기어다. 이 도시에는 파트타임 직업 세 개, 학교, 육아까지 동시에 해내는 ‘슈퍼휴먼’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고작 한 개 하는 학생 주제에, 피곤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저질 체력과 의지박약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다. 그래서 질문은 맥없는 넋두리로 변질된다. 아, 내 몸이 스마트폰이라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간단히 기력을 얻을 텐데……. 왜 ..
2016. 9. 30.
 해완's 뉴욕타임즈 마지막 이야기 - 가장 치열한 인류학의 현장, 뉴욕
뉴욕, 인류학의 도시 1935년, 레비스트로스는 문화 현장 조사를 위해 브라질 열대우림으로 떠난다. 인류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책 〈슬픈 열대〉가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 인류학 연구는 파죽지세로 진척되었고, 레비스트로스가 몸소 남긴 강렬한 이미지는 그대로 남았다. 일명, 오지로 떠나라! 였다. 인류의 다양성과 타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사명을 띤 채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로, 남미로, 호주로, 더 멀리 또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지금 여기, 인류학의 현장 그러나 왜 문명화가 ‘덜 된’ 장소만이 인류학적 가치를 지닌단 말인가? 갈취의 대상이든 탐구의 대상이든 간에 왜 타자는 언제나 ‘비서구권’으로 정의되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내가 문화인류학 입문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된 질문이다. 아니, 교수..
2015. 10. 30.
해완's 뉴욕타임즈 마지막 이야기 - 가장 치열한 인류학의 현장, 뉴욕
뉴욕, 인류학의 도시 1935년, 레비스트로스는 문화 현장 조사를 위해 브라질 열대우림으로 떠난다. 인류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책 〈슬픈 열대〉가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 인류학 연구는 파죽지세로 진척되었고, 레비스트로스가 몸소 남긴 강렬한 이미지는 그대로 남았다. 일명, 오지로 떠나라! 였다. 인류의 다양성과 타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사명을 띤 채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로, 남미로, 호주로, 더 멀리 또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지금 여기, 인류학의 현장 그러나 왜 문명화가 ‘덜 된’ 장소만이 인류학적 가치를 지닌단 말인가? 갈취의 대상이든 탐구의 대상이든 간에 왜 타자는 언제나 ‘비서구권’으로 정의되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내가 문화인류학 입문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된 질문이다. 아니, 교수..
2015. 10. 30.